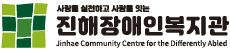페이지 정보

본문
차별없는 가게의 조건
‘가게’는 돈을 주고 무엇인가 사고파는 곳이다. 돈, 그리고 사고판다는 말을 놓고 보니 ‘가게’는 자본주의가 자연스럽게 일상에 녹아든 공간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요가 있고 그 수요에 맞춰 공급이 제공되는 곳. 내 돈을 주고 어떠한 ‘서비스’를 받는 곳이 가게이기에, 나쁘게 말하면 ‘돈이면 다 되는’ 곳이라 할 수 있겠다.
문제는 내가 돈을 아무리 더 준다 해도 들어갈 수 없는 가게들이 있다는 것이다. 가게에 들어가기도 참 어렵고, 돈을 냈음에도 나가기 직전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가게들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다. ‘돈이면 다 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주고도 갈 수 없는 가게들에 대한 이야기다.
먼저 20대 농청년의 이야기.
“저랑 제 (농인) 친구들이 함께 약속을 잡고 있었어요. 인원이 좀 돼서 카페 안에 단체석을 예약하려고 전화를 했죠. 통신 중계 서비스를 이용해서 전화를 하니 당연히 저희가 농인인 걸 카페 측에서도 알았어요. 그런데 대뜸 “가끔 청각장애인분들이 오셔서 본인들이 소리를 못 들으시니까 좀 크게 웃으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분들에게 방해가 돼서요. 그 부분을 좀 주의해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하더군요. 모두 함께 이용하는 곳이니 당연히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주의하는 게 예절이죠. 단지 궁금함이 생겼어요. ‘청인들은…… 안 웃나?’
사실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들은 시종일관 수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웃음소리 정도만 들리겠지만, 청인은 내내 입말로 대화를 하니, 늘 소리가 나지 않나요? 소근소근 이야기를 하다가, 웃는 소리도 소근소근, 그렇게 하나요? 멀리서 지켜보니 몇몇 청인들은 목을 뒤로 젖혀가며 웃을 때도 있던데. 그럴 때도 소리가 안 나나요?
흠…… 암튼 청인들은 정말 소리를 안 내고, 혹은 아주 잘 조절해서 웃는지. 아니면 농인들이 내는 소리가 거북한 것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 후로 카페에 갈 때마다 왠지 눈치가 보이긴 했어요.”
다음은 30대 예비맘의 이야기.
“저는 임신을 준비 중인 농인 여성입니다. 예쁜 아기를 잘 맞이하기 위해 산부인과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임신 전 검사를 비롯하여 준비할 것이 많더군요. 그런데 산부인과에 간 첫날부터, 참 불쾌한 일이 있었어요.
“검사 결과를 설명해야 하는데…… 필담으로 하면 50분은 더 걸릴 것 같으니 통역사나 다른 말할 수 있는 보호자를 데려오세요.”
우선 간단하게라도 알려주거나, 검사 결과지를 서면으로 주면 상황을 보고 통역사를 부르겠다고 했으나 어떤 것도 말해주지 않았어요. 필담으로 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만 반복해서 하더군요. 그래서 지인에게 부탁하여 영상전화로 수어통역을 받기로 했어요.
5분도 안 되어서 통화가 끝났어요. 필담으로 했어도 검사 결과에 관련된 것은 몇 문장이 되지 않을 내용이었죠. 다음 외래 시간에 통역사와 함께 진료를 보러 갔어요. 그 의사분께서 이야기하시더군요.
“내가 의사생활 20년 하면서, 이렇게 말 한마디도 못하고 수어만 하는 사람은 처음 봤네. 입모양을 전혀 못 읽어요? 말을 전혀 못 해요?”
순간 너무 황당하더군요.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 거지? 내가 왜 저런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하지? 순간 어린 시절로 돌아가 어른들에게 혼나는 기분이었어요.”
손짓으로 농인임을 밝히고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는데, 외국어 메뉴판을 주었다는 이야기나, 매일 아침 수영을 해보고자 수영장에 등록을 했는데 ‘장애인이 수영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책임질 수 없다’는 이유로 환불을 받은 이야기 등. 웃지 못할 여러 에피소드를 농사회에서 심심찮게 들을 수 있다.
‘장애인과 같은 공간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는 식의 차별은 이제 거의 없다. ‘당신은 장애인이니 다른 곳을 가세요!’라고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수어로 수다를 떨다 보면 마음씨 좋은 백반집 아주머니가 반찬을 산처럼 쌓아주는 일들을 더 자주 만나기도 한다. 기사식당 같은 경우는 계산 후 뒤늦게 영수증을 보고 음료수나 공깃밥 서비스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따뜻한 사람들, 따뜻한 가게들은 늘 존재한다.
하지만 ‘차별’이라는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거대한 폭력 속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다. 다소 비싸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의 ‘어머, 장애인들도 이런 데를 오나 봐’하는 시선. 메뉴판을 가리키거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메뉴를 주문했음에도 계속 열심히 입 모양을 보여주며 짜증 난다는 표정을 짓는 사람들. 분명히 농인임을 처음부터 밝혔음에도 음성언어로만 호명하여 농인을 2시간 넘게 대기 시키는 병원들. 등록부터 험난한 각종 학원, 헬스장은 넘어가자. 이 모든 것들 속에 ‘차별’이 있다. 처음부터 의도된 차별도 있겠지만, 무지에서 오는 차별이 대부분이다.
무료로 어떤 혜택을 달라고 외치는 이들은 없다. 미국 워싱턴의 스타벅스처럼 모든 직원에게 수어를 사용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는다. 내가 돈을 낸 만큼의 서비스 소비자로서, 고객으로서의 대접을 바라는 것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무리한 요구인가?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있다’는 말들은 주로 돈보다 중요한 것에 대한 가치를 드러낼 때 사용한다. 이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돈으로도 안 되는’ 일이 명백히 존재한다. 바로 ‘마음’에 관한 일이다. 농인을 비롯한 많은 소수자들의 언어, 문화는 그 존재 자체가 적은 수이기에 다수가 보기에는 무엇인가 낯설고 어색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기에 다수는 정상, 소수는 비정상이 되고 마는 것은 명백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는 결국 우리의 마음, 시선, 관점에서 비롯된다. 나와 다른 이들을 우리가 아닌 ‘이상한 그들’로 생각하는 순간 내가 아닌 너, 우리가 아닌 그들은 모두 ‘비정상’으로 정의되고 만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소수자를 위해 돈을 쓰는 일, 참 어렵다. 그래서 나라에 ‘사회복지’로 이 일 좀 해달라고 맡겨두었다지만, 사실 우리가 ‘살 맛 난다’는 말을 하게 되는 공간은 복지관이나 공공기관이 아닌 일상 속, 내 집 앞의 그 작은 가게가 아닐까. 나와 다른 사람들, 조금 어색해 보이는 방식, 그 모습. 이것들에 우리 마음을 내어 준다면, 돈 한 푼 안 써도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차별 없는 가게’를 만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왜 나처럼 말하지 않지?’, ‘왜 나처럼 듣지 않지?’ 나와 같지 않은 이들에게 나의 기준을 내보이지 말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 그들이 보여주는 그 기준에 한번 마음을 맞춰보자. 새로운 삶, 새로운 문화를 품는 일은 그렇게 시작될 것이다.
-출처 : 비마이너-
- 이전글2021년 장애인 재난 가이드 5종 1 21.10.25
- 다음글장애인 안전 사각지대 만드는 무서운 민원인들 21.10.22